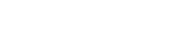소방관의 생명을 구하는 방열복
방열복이란 대형화재로 인하여 복사열이 강한 경우에 소방관이 화재 속에서 인명을 구출하거나 화재를 진입할 수 있도록 착용하는 옷이다. 2000년대 초 부산과 서울 효제동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방수기능만 있는 방수복을 입고 화재 진화를 하다가 목숨을 읽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로부터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방열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열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화재현장의 필수품인 방열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내열성이 강한 아라미드 탄생과 함께 시작
방열복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방열복의 섬유소재를 살펴봐야 한다. 방열복은 내열성이 강한 아라미드(aramid) 섬유의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특수 코팅한 겉감과 내열섬유의 중간층, 안감 등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단단한 섬유조직은 뜨거운 열을 반사시키고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방열복의 발명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1935년 아라미드 섬유의 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라미드란 폴리아미드 합성섬유 중에서 아미드기가 2개의 벤젠환과 직접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아라미드는 세계최초의 인조섬유인 나일론보다 높은 강도의 섬유 개발을 진행하던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듀퐁(Du Pont)사의 과학자들이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나일론을 최초로 개발하기도 한 듀퐁 과학자들은 철조망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나일론의 분자배열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년 간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얽힘이 적은 강직한 고분자 사슬을 만들어냈으나 이번엔 분자사슬이 서로 엉키면서 실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하는데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혔지만, 과학자 중 한 명인 스테피아 크오렉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점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용액을 사용해 분자사슬이 얽이지 않고 실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그 결과, 나일론보다 훨씬 강하고 늘어짐이 적고 가위로도 잘 끊어지지 않는 강한 섬유, 아라미드가 탄생했다.
내열성, 강인성, 탄성이 뛰어나 ‘슈퍼섬유’, ‘마법의 실’라고 불리는 아라미드는 항공우주, 군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방열복이다. 현재 방열복은 아리미드를 주 섬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피에만 발수처리를 하여 수분이 방열복 안으로 투입되어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열전도의 위험성을 막고 있다.
이처럼 내연성이 강한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방열복은 소방관들을 직접적인 불꽃 접촉, 고온 노출, 강한 복사열, 고온의 수증기, 화약약품, 유해물질, 전기감전 등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 첫 번째 소재는 듀폰 Nomex IIIA 아라미드 100% 방열복이며, 두 번째는 방염 처리된 면 방화복, 세 번째는 합성섬유 소재인 폴리(기능성 포함)다. - 출처 : 유튜브 soo, hyun Jeon
우리나라 방화복·방열복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방열복을 착용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방화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화복은 방열복과 같이 화재현장에서 생존과 화상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옷이지만, 완전무결하지는 않다. 불로부터의 완벽한 보호가 아닌, 외부의 열기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해주는 수준이다. 방화복에서 기능이 한층 발전된 것이 바로 방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방화복이 개발되었는데, 처음에 방화복 소재는 뜨거운 그릇을 만지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화재현장의 열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화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소재를 보강해 내열성을 높인 방화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발전을 거듭해 방화복보다 한층 기능이 강화된 방열복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장비·섬유 관련 업체 등에서는 더욱 기능이 향상되고 움직임이 편리한 방열복을 만들기 위해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