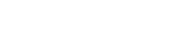“신성한 궁에 함부로 침입한 불귀신은 썩 물렀거라!”
‘자나 깨나 불조심’은 시대를 막론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 궁궐은 건축물 대다수가 목재이기에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운 반면 번지기는 쉬워 노심초사하기 일쑤였다. 일찍이 다양한 소방설비를 마련하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 까닭이다. 당시 흔적은 긴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궁 안 곳곳에 남아 있다.
흉악한 얼굴을 비춰 화마를 쫓아내는 정결한 물 항아리_드므

우리나라 경복궁의 드므(왼쪽)와 중국 자금성의 태평수항(오른쪽)
오늘날 각종 건축물의 일정 면적마다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듯이 궁궐에선 정전(正殿, 왕이 정사를 돌보는 곳)과 같이 중요한 건물 네 귀퉁이에 물을 담은 커다란 항아리, ‘드므’를 놓았다. 이는 불에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청동과 돌로 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원형과 방형이지만, 솥을 떠올리게 하는 모양도 있다. 덕수궁 중화전 양쪽에 있는 건 화로처럼 생겼는데 겨울에 물이 얼면 소방용수로 즉각 쓰기 어렵기에 불을 때 녹이기 위해서다.

창덕궁 건물 한쪽 귀퉁이에 놓인 청동 항아리, 드므
비단 설비로서의 용도만이 아니라 주술적 의미까지 갖추고 있다. 민간 설화에 따르면 불귀신은 용모가 흉측하게 생겼단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놓으면 호기심에 제 얼굴을 비춰보곤 화들짝 놀라 도망간다고.
참고로 드므의 원조는 중국에서 문 앞에 두는 문해(門海)다. 입구를 지키는 바다라는 뜻으로, 자금성의 태평수항(太平水缸)이 대표적이다. 한편 민간에선 항아리 대신 우물을 파서 화재 진압에 대비했다.
인기 만점 데이트 장소가 알고 보니 방화벽_방화장(防火墻)

주지하다시피 궁궐은 불이 옮겨붙기 쉬운 목조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에 따르면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건물마다 방화장이라는 높은 벽을 쌓고, 바깥에 두텁게 흙을 한 번 더 올렸다. 일종의 방화벽인 셈이다.
또, 궁성 가까이에 있거나 곡식을 저장하는 관청 가까이에 붙어 있는 가옥은 철거하고, 도로는 사방으로 통하도록 뚫었다. 화마가 기승을 부릴 때 궁과 민가가 서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대표적인 방화장 가운데 하나인 덕수궁의 돌담
이처럼 소방 안전에 힘쓴 자취는 경복궁, 종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는 건 연인이 만나 산책하기 좋은 데이트 코스로 익히 알려진 덕수궁 돌담길의 담장이 실은 방화장이라는 사실이다.
용의 둘째 아드님, 지붕 위에서 뭐 하세요?_취두(鷲頭)와 쇠고리

물을 뿜는 모습으로 지붕 위에 올라 있는 용의 둘째 아들, 이문
이제 지붕을 들여다보자. 어디서 많이 본 상상의 동물이 용마루에 올라 있을 거다. 당연히 왕이 기거하던 곳이니 용(龍)이라고 단정 지으면 곤란하다. 정확히는 용에게서 태어났으나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홉 아들 가운데 둘째인 이문(螭吻)이다. 높은 데서 멀리 내다보는 걸 좋아하고 입으로 물을 뿜으면 비가 내린다고 해서 중국 당나라 때부터 지붕에 세우던 게 어느새 궁에 들어왔다.
이를 아로새긴 지붕골 끝 기와가 취두이며 치문이나 치미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은 하지 않지만, 늘 불조심하라는 마음가짐을 전하는 만큼 상징적 측면에서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취두와는 별도로 실질적 수행을 맡은 소방 설비가 있으니 경복궁의 수정전·경회루, 종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쇠고리다. 지붕에 걸려 있는 이 사슬은 인력이 심한 경사에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고 진화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몸에 묶은 줄을 잡아줬다.
궁에서 화재 진압에 사용한 3대 소방 설비_구화기(救火器)

화재 시 소방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공급처였던 궁 안의 연못
지금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캠페인을 강조하지만, 궁궐에선 화재를 두고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 곤장 100대에 달하는 중죄였다. 오히려 비치한 구화기, 즉 각종 소화 설비를 찾아들고 불씨 제압에 나서야 올바른 도리로 여긴 거다.
그렇다면 당시엔 화재 진압에 무엇을 사용했을까. 먼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 불을 끄는 사다리인 구화제자(救火梯子)가 있었다. 또, 요새로 치면 소방용 물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저수조인 저수지기(貯水池器)로 소방용수를 공급받았다. 이를 퍼서 뿌리는 그릇은 급수지구(汲水之具)라고 일컬었다. 비록 요즘만큼 최신식은 아니지만, 미연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마찬가지였다.
■ 궁 내 화재 진압을 책임지는 곳은? 금화도감(禁火都監)!

궁궐의 화재 진화 작업에 나선 관리들의 모습
조선 시대 궁궐엔 오늘날의 소방서에 해당하는 관청인 금화도감이 있었다. 1426년(세종 8년)에 설치한 이곳에 속한 인원은 제조 7명, 사(使) 5명, 판관 각 6명이었단다. 당연히 이들만으로는 드넓은 궁의 화재를 모조리 진압하기엔 무리가 있다. 즉 불이 났을 때 직접 출동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보다는 방재(防災)와 주변 물길 수리를 주 업무로 수행했고, 백성들이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도록 지도했다.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이 중점적으로 하는 화재 예방과 안전 교육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금화도감을 세운 그해 8월엔 이조의 건의로 도성 성곽을 수리하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통합해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이 별로 많지 않다는 이유로 1460년(세조 6년) 5월, 각 중앙 관서의 인원 감축이 대폭 이뤄지면서 폐지해 수성은 공조(工曹), 금화는 한성부로 이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글 ∣ 오민영(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