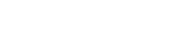찬란한 문명의 기틀을 다진
고대 국가를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展>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기원전 8세기 무렵 전 세계에 막강한 파급력을 떨친 로마제국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런데 이에 앞서 약 1,000년 간 지중해를 중심으로 번영을 이룬 문명이 있었다. 바로 에트루리아다. 비록 새로운 세력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한때 이탈리아 북부와 코르시카섬을 당당히 지배한 바 있는 이 고대 국가가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展>을 통해 시간의 베일을 거두고 우리 앞에 섰다.

에트루리아가 없었다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표기하는 로마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 알파벳의 기원인 그리스 문자를 적절하게 변형해 로마 문명에 전한 민족인 까닭이다. 그러나 고대 지중해 문명의 패권을 뺏기는 바람에 언어를 지칭하는 이름에 오르지 못하고 역사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추고야 말았다.
물론 그와 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멸망한 고대 국가는 한둘이 아니겠지만,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展>를 대중 앞에 선보인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일찍이 꽃피운 독자적 문화를 토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문명의 기반을 전수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지중해의 푸른 파도 너머 2,300년 전 에트루리아로 가는 길

지난 7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네 달간 약 300여 점의 전시품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비디오 아트와 도슨트 해설(약 50분) 등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지중해의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풍경을 형상화한 터널에 발을 내디디면 2,300년 전 에트루리아가 열린다.
저승의 신을 의미하는 반트를 새긴 석상을 뒤로하고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지중해의 가려진 보물, 에트루리아> 전시실과 만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이곳은 석상, 유골함, 암포라 등에 신화 속 인물을 생생히 그려 놨다.

특히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제작한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묘사한 유골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홀려 바다로 끌어들이는 인어 세이렌의 머릿결과 형태까지 완벽하게 표현했다. 당시엔 요사스러운 존재로 치부한 세이렌이 현재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로고 속 모델이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매우 흥미롭다.
따사로운 봄날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다

<천상의 신과 봉헌물> 전시실의 중앙에 자리한 유물은 신전의 일부를 모아 재현한 작품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흙, 나무 등과 같은 재료를 주로 사용한 에트루리아의 건축물은 남아 있는 게 거의 전무해 재구성하기가 상당히 험난했다고. 발굴한 대리석 조각을 잇고 유골함에 새겨진 구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보태야 했단다. 이는 주로 대리석을 활용해 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그리스·로마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따사로운 봄날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전시 해설 글귀가 유난히 쓸쓸하게 맴도는 건 그저 기분 탓만은 아니리라.

티니아(그리스의 제우스·로마의 유피테르)와 우니(그리스의 헤라·로마의 유노), 그리고 멘르바(그리스의 아테나·로마의 미네르바)라는 세 명의 신을 믿은 에트루리아에선 인간의 운명이 그들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제에게 미래를 묻길 즐겼으며, 가축을 잡아 내장 형태를 보고 예언하는 점성술이 발달했다.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찬연했던 금속공예 문화

<에트루리아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실에선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귀족들은 화려한 사치품과 문화에 심취해 거대한 무덤을 짓거나 집 지붕에 호화스러운 장식 기와를 얹었다. 또, 기원전 6세기부터 자치권을 지닌 도시국가로 성장하면서 축제를 열고 무용, 음악, 교양 등을 배우고 뽐내고자 했다. 잘 닦인 도로를 거침없이 달리던 전차에선 활기찬 에트루리아의 기상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한편 <저승의 신과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전시실에선 망자를 위한 종교의식과 의례에 힘썼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프지만, 자애로운 신인 반트가 횃불을 듣고 어두운 저승길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위로를 느꼈다고.


무덤에서 발굴한 황금 화관·월계관과 각종 장신구에선 찬연했던 금속공예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착용하기 가벼우면서 반짝거리도록 세공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유행은 부를 과시하고 싶었던 인간적 본능과 멀지 않다.


현대인의 오늘날과 살아 숨 쉬고 있는 고대 국가

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목인 <에트루리아와 로마> 전시실에 다다르면 이제껏 본 유물의 의미를 다시금 음미해볼 수밖에 없다. 로마의 칼날 아래 멸망했으나 정작 건축, 문화, 예술 등은 고스란히 남아 전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 신기하게 다가온다.
세상으로 뻗어가는 길인 포장도로를 증축하고 광장, 수로 시설, 대규모 사원 등을 지은 시초가 에트루리아라면 믿을 수 있을까. 기원전 396년을 기점으로 점차 몰락한 고대국가는 세월에 의해 흩어졌지만, 먼 옛날 전파한 지식과 예술혼은 현대인의 오늘날과 함께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들은 삶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자유롭고 즐겁게 숨 쉬도록 내버려 둔다.
심지어 무덤들조차도.
이것이 진정한 에트루리아의 가치다.
즉, 편안함, 자연스러움,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
지성이나 영혼을 어떤 방향으로도 강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 D.H 로렌스(David Herbert Lawrence)의 <에트루리아 유적 여행기> 중
■ 국립중앙박물관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展>
주말 · 공휴일 - 10시 30분
어린이 · 청소년(8~25세) - 5,000원(개인) / 4,000원(단체, 20명 이상)
유아와 노약자(7세 이하 · 66세 이상) - 무료
글 ∣ 오민영(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