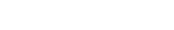소방 방화시설의 역사Ⅵ
(소방차)
화재의 위협
도시가 마을과 구별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오랫동안 화재는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였다. 기원후부터 헤아리더라도 로마 대화재, 런던 대화재,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대화재 등 도시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주는 화재부터 도시를 구성하는 개별 건축물에서도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코코넛 그로브,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이로큐스 극장 화재 등을 겪으며 쌓아온 교훈들은 성숙한 도시를 가진 여러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의 건물 무리들은 도로로 나눠지고 서로간의 최소한 거리가 강제적으로 멀어졌고, 건축물 안에서도 화재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치는데 그치도록 각각의 내부는 구획되었다. 심지어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에 끌 수 있도록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우리는 고층 건물 안에서도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편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화재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성장하는 특성이 있으며 규모가 커져버린 화재는 지금도 통제 불가능하다.
소방차의 의의
소방차는 건물 내부의 소방시설 영역의 사각지대나, 소화능력을 초과한 화재, 또는 건물 외부의 화재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화재초기에 저지하고 진화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요소인 인원, 장비, 소방용수를 통틀어 소방력이라 하는데 소방력에서 소방차는 움직이지 않는 소방용수를 사람이 의도한 공간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 핵심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소방차의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별 연혁에 따라 현재의 소방차가 모습이 갖춰지게 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방차의 기능은 크게 펌프로 물에 힘을 가하는 것, 사다리와 같은 구조물로 행사하는 물리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동력을 이용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소방 펌프
소방차의 펌프는 가장 원시적 용적형 펌프인 주사기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알렉산드리아의 이발사 출신 발명가 크테시비우스(Κτησίβιο)는 원통형 실린더의 한 쪽 끝 부분에 좁은 노즐을 달고, 반대쪽에는 헝겊 등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피스톤과 피스톤에 힘을 전달하기 위한 막대를 부착한 주사기와 유사한 화재진압용 펌프인 스쿼츠(Squirts)를 만들었다. 또 공기가 지나가 소리를 내는, 현재의 피아노의 원형인 물오르간에 안정적으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똑같은 피스톤 펌프를 병렬로 배치한 발명을 했는데 이 두 발명은 소방차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스쿼츠’는 작은 용량 탓에 정작 화재현장에서 큰 효용은 없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화재의 뜨거운 복사열을 피해 먼 거리에서 물을 쏠 수 있는 장점 덕에 중세까지 유럽의 화재진압 전용 도구로 명맥을 이어갔다. ‘스쿼츠’의 단점인 작은 물 용량을 개선하려는 발상은 프랑스 발명가 자크 배송(Jacques Besson)에 의해서였다. 1572년 그가 작성한 '위대한 기계와 도구'(Theatrum Instrumentorum)
에서 실린더의 내용적을 키우고 직경이 넓어진 대신 짧아진 실린더의 스트로크를 피스톤에 운동용 나사를 달아 회전운동으로 전진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바퀴를 달아 이동이 용이한 장치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재현된 실물이나 실제 운용되었다는 증거가 희박한 한계가 있다.
1650년 독일 뉘른베르크(Nürnberg)의 대장장이인 한스 하우츠(Hans Hautsch)는 주사기형 펌프 두 개를 뉘어서 배치하고 바퀴를 달아 말이 끌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소방펌프를 만들었다. 한 개의 주사기에 양쪽에 14명의 남성이 교대로 막대를 밀고 당겨 동작하고, 여성들은 양동이로 물을 길어와 수조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동작한 이 펌프는 최대 20m까지 물을 분사할 수 있었지만, 분사량에 못 미치는 물 공급량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전해진다.
소방 호스
런던대화재 이후 화재의 공포가 유럽전역으로 퍼져갔고 1672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이자 토목 공무원인 얀 반 데르 헤이덴(Jan van der Heyden)은 형제와 함께 암스테르담에 있던 한스 하우츠의 소방펌프를 개선한 이동식 소방펌프를 만들었다.
이 소방펌프에는 크세티비우스가 물 오르간에 사용했던 병렬 피스톤 펌프가 적용되었다. 주사기형 펌프는 압축행정을 할 때만 물이 분사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는데 병렬 피스톤 펌프는 한쪽이 압축할 때 다른 한 쪽의 펌프는 흡입하는 행정을 해 비록 맥동은 있지만 물줄기가 비교적 연속으로 나갈 수 있었다.
헤이덴은 현재 소방차의 운용 전술에 결정적 도구인 소방호스도 최초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호스의 발명으로 화재에 닿아야 하는 물줄기는 노즐의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사람의 발길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물리적 영역의 범위를 확장되었다.
최초의 호스는 선박의 돛을 만드는 튼튼한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된 호스는 소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여러 장의 소가죽을 덧대고 꿰매 양 쪽 끝에 펌프와 연결할 수 있도록 황동 결속구를 달아 50피트 길이로 만들었는데 15미터인 호스길이와 결속구로 호스를 연결하는 원리는 유럽과 우리나라 소방호스의 표준 규격으로 남아있다. 호스 중 일부는 가죽 중간에 용수철 모양의 철심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 호스는 펌프의 흡입능력으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올 때 찌그러지는 것을 막았다. 펌프가 직접 호스로 물을 끌어오게 되며 더 이상 사람들이 양동이로 물을 힘들게 옮길 필요도 없어졌다. 헤이든의 발명은 화재를 진압하는 행동양식을 다수인이 참여하는 양동이 행렬을 소수의 사람이 운용하는 소방펌프로 바꾸게 했으며, 소방펌프를 운용할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해짐에 따라 공공 소방대가 만들어 지게 했다.
런던대화재 이후 보다 강화된 방화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화재방어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시 상수도 시스템과 이에 따른 제철 기술, 펌프제작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개선된 수동 소방펌프가 등장했다. 대화재 직후 독일 한스 하우츠의 소방펌프를 영국 자체적으로 개선했던 존 킬링((John Keeling)의 소방펌프는 네덜란드 출신 존 로프팅(John Lofting)의 개선으로 얀 반 데르 헤이덴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1718년 리차드 뉴삼(Richard Newsham)은 수동소방펌프를 실용적 수준으로 만들었고 화재진압의 표준적 장비가 되었다.
근대 소방차의 발전
신생국가인 미국의 뉴욕, 보스턴 등 일부 대도시는 뉴삼의 소방펌프를 도입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역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화재진압도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원봉사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의 기금으로 소방펌프가 도입되었고 독립전쟁 이후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와 윌리엄 헌만(William Hunneman)은 좁은 도시골목에서도 조작이 쉬운 수동소방펌프를 만들었고, 필라델피아의 패트릭 라이언은(Patrick Lyon)은 자신이 소속한 조합에서 말이 끌 수 있고 펌프의 기밀이 뛰어난 수동 소방펌프를 만들었다.
가죽 소방호스는 무거워서 사용도 힘들고 평상시 소, 대구, 고래의 기름을 발라 놓아야해 비용도 많이 들고, 실이 자주 썩어 사용 시 터지기 일쑤였다. 1807년 제임스 셀러스(James Sellers)가 실 대신 금속 리벳으로 소방호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새로운 호스로 1마일 밖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되었고 화재진압 전술에서 호스의 비중이 커지며 호스를 운반할 전용의 차량이 필요해졌다.
1821년 제임스 보이드(James Boyd)는 캔버스천에 고무코팅을 한 소방호스를 만들어 현재의 것과 유사해졌다. 1873년 소방호스의 규격이 국제 소방 엔지니어링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 표준화 되었다.
미국의 화재에 관한 상호부조 협동조합은 화재 시 각각 회원이 자원봉사로 진압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모습을 갖춰갔고, 각각의 편익을 추구하는 목적은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소방호스와 같은 도구의 발전으로 화재진압 전술이 다양해지며 각각 소방대는 소방펌프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것과 같이 사다리와 구조(ladder & rescue), 소방호스(Hose Company No.1) 등 전문영역의 조합소속 소방대가 등장했다. 도시의 건축물이 복수의 층이 된 이후 사다리는 건축물 화재에서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부피가 커서 평상시 조합의 창고에 보관하다 화재 시에 소방관이 직접 운반했는데 17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다리를 전용으로 운반하기 위해 7미터 길이의 차량이 만들어졌다. 이 차에는 3개의 사다리와 8개의 가죽양동이, 야간 조명을 위한 횃불과 등불, 도끼와 갈고리 같은 도구가 실려 있었다. 1820년 에이브러햄 위밸(Abraham Wivell)은 재산보호에만 치우친 소방대의 역할과 장비에 반발해 화재로 퇴로가 막힌 2층 이상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목적으로 접이식 사다리에 바퀴를 단 피난기구를 만들었다. 사다리는 2층 길이로 되어있고 연장하면 4층 까지 닿을 수 있었는데, 펼친 사다리의 밑에는 천으로 만든 구멍이 뚫려 있는 긴 자루를 달아 여러 사람이 미끄럼을 타듯 피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사다리와 부가장치, 화재진압을 위한 여러 장비를 수레에 싣는 것은 지금의 소방차의 기본적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동(自動) 소방차
18세기 중반의 증기력의 활용이라는 시대적 전환은 소방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증기력은 석탄, 탄광, 바닥의 물을 퍼 올리며 발전해 도시 상수도를 흐르게 하는 힘으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했다.
1829년에는 영국의 브라이스 웨이트(John Braithwaite)와 에릭슨(john Ericsson)은 ‘참신하다‘는 의미를 가진 ‘Novelty’라고 이름이 붙은 증기 동력 소방펌프를 최초로 만들었다. 증기력 소방펌프는 조악한 제조기술 탓에 폭발 등 사고가 잇달았지만, 화재에는 강력했으며, 움직일 때 까지 예열시간이 너무 긴 단점에도 빈약한 사람의 힘을 대신하는 막강한 장점을 가져서 대도시를 가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증기에 대한 관심은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1835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폴 호지(Paul Rapsey Hodge)는 화재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1840년경 최초로 증기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소방펌프를 만들었다. 증기기관을 활용한 스스로 움직이는 소방펌프는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발전했고 만국 박람회에서 그 성능을 서로 견주었다.
현대 소방차
내연기관의 선구자 고틀리프 다임러(Gottlieb Daimler)는 소방펌프에도 관심이 많았다. 1888년에는 최소 15분을 기다려야 작동이 시작됐던 증기 소방펌프를 대신해 가솔린의 힘으로 즉각 동작할 수 있는 내연기관 피스톤 펌프를 만들었고 자신이 거주하는 깃털을 원료로 침구를 만드는 공장의 화재에서 사용해 내연기관 펌프의 신뢰성을 보여줬다.
말이 끄는 증기소방펌프를 만들던 영국의 ‘Merryweather & Sons’는 증기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소방차인 ‘Fire King’을 만들었고 내연기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1904년 내연기관 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동력을 인출해 펌프도 동작시키는 소방차를 만들어 공공 소방대에 납품했다. 이에 자극 받은 미국의 대표적 소방펌프 제조업체의 연합조직의 모체였던 ‘American LaFrance Fire Engine Company‘ 역시 내연기관 동력 소방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소방펌프는 주로 복수의 피스톤 펌프를 병렬로 배치한 용적형 펌프여서, 고장이 잦아 많은 비용이 드는 유지보수가 필요했다. 맥동현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유량이 작은 단점이 있었다.
1912년 미국 미시간의 소방차 제조업체인 ‘Seagrave’는 소방펌프의 형식으로 원심펌프를 적용했다.
세계대전과 인명피해가 많던 화재들을 경험하며 기술이 발전했고, 화재진압의 목적이 재산의 보호에서 인명의 보호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빈약하던 경종의 경고는 강력한 사이렌으로 바뀌었고, 통고무 타이어는 가운데 공기가 들어간 타이어로 바뀌었다. 도로의 사정과 동력의 크기로 결정되던 차체의 크기는 한정적이어서 소방차의 여러 기능은 분화되었다. 물만 싣고 다니는 물탱크 차가 등장했고, 사다리와 장비만 싣고 다니는 차량도 등장했다.
1903년 ‘Merryweather’에서는 1820년대 위벨의 피난기구와 대형 소다산 소화기를 장착한 사다리차의 원형을 만들었고 1914년 독일의 ‘Magirus’에서는 차량의 동력으로 펼치고 회전하는 ‘턴 테이블’ 사다리차를 만들었다. 고층건물이 많아지던 미국에서 사다리차의 수요가 많았고 이에 대응해 ‘Peter Pirsch & Sons’에서는 트러스 구조의 인출식 사다리를 유압으로 동작하게 하는 사다리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20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진 소방차들은 도시의 성장과정에 맞춰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뼈아픈 사고들을 겪으며 기능들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 소방차들 모습의 원형이 되었다.
소방차의 객관적 능력
현재의 소방차는 상용차의 차대에 특장이라고 부르는 소방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을 장착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사시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곳곳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소방차의 능력이 과장되어 표현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부에 배치된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사의 ‘판터‘는 배기량 32리터에 1,400마력의 힘으로 움직이고 약 2만 리터의 물을 싣고 다니며 분당 1만 리터를 분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위 소방차의 끝판 왕이라고 까지 칭해진다. 하지만 최첨단 소방차의 능력이라도 초대형 화재의 힘 앞에선 무력할 뿐이다. ’판터‘ 역시 제네바 공항을 건설할 때 공항에서의 화재사고를 염두에 두고 주문한 소방차로서 그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다.
‘판터’를 포함해 소방차는 대체로 무거우며 현장으로 빠르게 도착하는 것은 도로망이 양호한 공간에 한정된다. 도로의 정체, 신호체계, 불법주차는 출동시간을 지연시키지만, 무엇보다 비포장도로의 진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사다리차의 능력 역시 이상적 환경에서 펼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만큼 전개 할 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으며, 불안정한 지면에서부터 뻗어 나온 사다리의 말단에서 발휘되는 물리력 역시 기대할 만큼 큰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소방차의 연혁을 살펴보았듯 소방차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로의 폭, 건물의 높이, 각 국가의 도시에 적합하게 발전해 온 특수성이 있으며 도로가 소방차의 크기를, 소방차의 크기가 동력의 크기와 싣는 물의 양, 장비의 양을 규정한다.
때문에 하나의 소방차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출 수 없고, 규정된 한계에서 각각의 기능은 여러 차량으로 분화되어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구조차, 배연차, 조명차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소방차는 여전히 도시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력의 기준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최근 국민의 관심 속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미 성장해 버린 화재에는 최첨단 소방차라도 그 능력이 무의미해진다. 소방차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재가 성장하기 전 빠르게 도착하는 것과 출동 지령을 내리는 신고접수자가 화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합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도로상황이 열악한 실정과 화재현장의 당황스러운 비일상성 등 극복하기 힘든 목표지만, 결국 공동체의 안전이 내 안전이라는 사실에 근래와 같이 충분한 관심이 모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본다.
글. 송병준(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